01한국가족의 특징
한국의 가족생활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한국가족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가족 생활이 좀 수월할 수 있으며,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문화는 각 가정마다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에 한국 가족문화는 유교문화권 국가들과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가족문화도 점차 변하고 있다.
(1)가족관계
- 가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 못지않게 가족 간의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가족 내 위, 아래의 순위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 가정에서는 부모, 조부모, 친척 중 웃어른을 공경할 것을 가르친다.
- 성인자녀가 노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하는 경우도 있으나, 노후를 자립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노부모의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 다양화된 사회와 인식의 변화, 그 외 여러 요인들로 인해 가족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다.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입양 가족, 재혼 가족, 1인 가족 등 여러 형태의 가족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2)부부관계
- 부부 간의 관계도 좋아야 하지만, 가족 내에서 자녀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긴다.
- 가족과 관련된 일에서 남편과 아내가 상의하여 의사결정을 함께 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가족 부양, 자녀 돌봄, 가사 노동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 돌봄 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3)가족생활의 적응
결혼을 통해 가족관계, 생활방식, 사고방식이 서로 다른 개개인이 한 가족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생활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결혼 초기에는 매우 중요하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는 국제결혼의 경우 가족생활에 대한 생각 차이는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배우자와 생각 차이로 가족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한다.
- 서로의 가족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가족 전통 물어보기
- 가족생활에서 힘든 부분은 대화하여 해결하기
-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 요청하기
- 전문상담기관인 다누리콜센터(☎1577-1366) 이용하기
-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상담원과 의논해 보는 것이 좋으므로,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이용한다.
02언어예절
한국에서는 같은 대상이라도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부르거나 말하게 된다. 또 순수한 우리말 칭호와 한자말이 섞여서 쓰이고 있다. 때문에 호칭이나 지칭을 잘못 쓰면 무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호칭’이란 어떤 사람을 직접 부르는 말이고, ‘지칭’이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가리키는 말인데 모두 말할 때는 ‘칭호’라 한다.
(1)존댓말과 보통말
한국말은 상대방의 연령, 관계의 친밀성, 지위 등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 상대방을 높이는 존댓말(높임말)과 높이거나 낮추는 말이 아닌 보통말이 있다.
- 상대방이 연령이 높은 사람이거나 지위가 높은 경우, 또는 공적인 장소에서는 높임말을 사용한다.
- 상대방이 친구이거나 아랫사람 또는 어린이인 경우에는 보통말을 사용한다.
예)
밥 먹다(보통말) / 진지 잡수시다(높임말)
고마워(보통말) / 감사드립니다(높임말)
잘 있어(보통말) / 안녕히 계십시오(높임말)
03가족생활에서 기억하고 축하할 날
가족생활에는 아기의 탄생, 결혼, 죽음 등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에게 중요한 일이므로, 이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거나 슬픈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예의다.
(1)탄생 의례
- 백일 :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지 백일 되는 날을 기념한다. 백일 음식으로 백설기, 붉은팥으로 만든 수수경단, 미역국을 마련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 축하해 준다.
- 돌 : 아기가 태어난 지 1년 되는 첫 생일에 친척 및 친지들을 초대하여 돌잔치를 한다. 아기에게는 한복을 입히고 돌상을 차려준다. 전통적으로 돌상에는 백설기, 송편, 수수경단을 마련하고, 아이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돌잡이(아기가 무엇을 잡는지 봄)라는 특별한 의식을 하기도 하며, 덕담(좋은 말)과 함께 선물을 준다. 최근에는 식당에서 돌상을 준비해주는 경우도 있다.
- 생일 : 태어난 날을 말하며 어른의 경우 ‘생신’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생일날 아침 식사로 미역국을 끓여 먹는다. 가정 형편에 따라 맛있는 음식을 차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을 초대한다. 초대받은 사람은 생일(생신)을 맞은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선물하거나 현금을 주기도 한다.
- < 현대식 돌상차림 >

(2)혼례(결혼)
전통적인 방식의 결혼식과 현대식 결혼식이 있는데, 전통적 방식의 결혼식은 현재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현대식으로 한다. 현대식 결혼식은 결혼식장이나 호텔, 교회, 절 등에서 할 수 있다. 신랑은 턱시도,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한다. 현대식 결혼식을 하더라도 신랑 신부가 부모, 친척에게 하는 공식 인사는 전통식 결혼처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사를 ‘폐백’이라고 한다.
(3)회갑·고희연(장수를 바라는 예식)
- 회갑 : 만 60세(한국나이로 61세)가 되는 해의 생일날을 의미한다. 수명이 짧았던 과거에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마련하는 행사이다. 수명이 길어진 요즘에는 간단한 축하의식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잔치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여행을 보내드리거나, 현금을 포함한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전해 드리기도 한다.
- 고희연 : 만 70세(한국나이로 71세)가 되는 해의 생일날을 의미한다.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여 매년 맞이하는 생일보다 더 크게 생일잔치를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한다.
(4)장례
사람이 죽은 경우에 갖추는 예의를 말한다.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은 상복을 입고, 고인에게는 수의를 입힌다. 일반적으로 수의는 연세가 높은 어르신의 생전에 준비한다.
상복은 집안 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베옷을 입는 경우도 있으며, 주로 흰색, 검은색의 옷을 입는다. 문상* 가는 손님들은 너무 화려한 색깔의 옷은 피하고, 검은색 또는 흰색 종류의 옷을 입으면 좋다. 문상을 할 때는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 준비한 방법대로 기도 또는 절을 함으로써 슬픈 마음을 전한다. 형편에 맞게 ‘조의금(현금)’을 낸다.
- 문상 : 돌아가신 분의 가족에게 슬픈 마음을 드러내어 위문하는 것
(5)제례
돌아가신 부모를 기리는 의식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혹은 그 전날 밤에 행해지는데,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참가자들은 옷차림을 검소하게 하며 고인을 기리는 마음을 가진다. 가족 문화에 따라, 개인의 종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기제사 : 조상이 돌아가신 날 밤에 지내는 제사로서, 보통 조상 2대조까지 한다.
- 차례 : 차례는 명절에 조상을 위하여 지내는 제사로서, 신년 차례, 한식 차례, 추석 차례가 있다.
- < 기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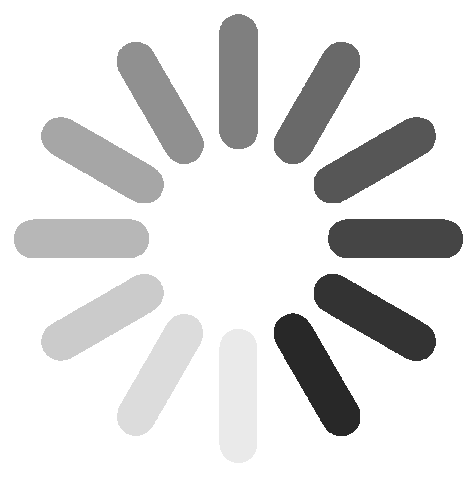 다운로드 중 입니다
다운로드 중 입니다



